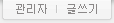Thoughts 2008. 3. 9. 23:51
(080308) 술자리
차라리 '곤욕'이다. 술자리를 갖는 것은 말이다.
나는 원래 술을 싫어하지도 않지만, 폭주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술이 아주 세지도 않지만, 몸을 못가누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런 내가 술자리가 곤욕스러운 것은 그 '어떠한' 자리 때문이다.
<빈센트 반 고흐作- '압상트가 있는 정물'>

고등학교 때는 호기심에 몰래 숨어 그 긴장을 즐기며 그 맛도 멋도 잘모르겠지만, 그 술 한모금은 나 역시 이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마법이었다. 당당하지는 못했지만 그 술은 친구들과 우리만의 작은 일탈이었고 비밀결사조직의 위대한 거사였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고민을 술 한모금을 숨어마시며 해갈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귀.여.웠.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대학 시절엔 이제 더이상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썩소를 날려주는 여유를 보이며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었다. 당당한 호기로 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마음껏 나의 주량을 시험에 볼 수 있는 수많은 나날들이 있고, 질보단 양으로 녹색의 소주들로 주로 점철됐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안주는 급한대로 새우깡, 참치캔 정도만 되도 끄떡이 없었다. 술은 곧 목적이었다. 좋은날은 좋은 날이어서 우울한 날은 우울한 날이어서 비가오면 비가와서, 날이 좋으면 날이 너무 좋아서, 시험공부를 하다가는 긴장을 풀려고 시험이 끝나면 끝났기 때문에 마셔댔다. 항상 붙어다니는 친구들 옆에는 항상 술도 있었다. 그 술은 어찌보면 우리들의 인사였고, 돈없는 대학생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동시에 하나의 장(場)의 마련이었다.
군대에서의 술은 각져있는 생활로부터 잠시 빽투더 사회로 하게 해주는 일종의 타임머신이었다. 휴가자가 몰래 숨겨온 소주를 양철컵에 반 잔따라 불조차 키지 못하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내무실에서 한입에 털어넣고 바로 누우면 '비~잉'하고 돌며 아주 오랜만에 취기를 안고 잘 수있는 최고의 호사였다.
앞서 말했듯이 난 술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술 마시는 걸 싫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인즉 술이 필요한 날이면 같이 한 사람들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나왔고 고민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아닌 남들과 단순한 교류가 아닌 교감을 할수 있는 촉매제였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랬다.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왁자지껄 마시는 것보단, 한 두명 많아야 세명 정도와 마시는 것이 가장 흐뭇했고 만취하기 보다는 유머와 말장난이 서로 오갈 수 있고 너무 무겁지 않도록 고민들을 살짝 풀어놓을 정도를 가장 좋아했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좋았고, 신나는 음악도 좋지만 술을 마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B.G.M이면 족했다. 나는 그랬다.
회사를 들어가고 돈도 벌고 나이도 슬쩍 앞자리가 바뀌어 더 이상 술은 호기심이나 정복의 대상일 수 없고, 그 자리의 수와 형태는 점점 더 많아져 갔다. 학교를 다닐때 만해도 큰 맘을 먹거나, 먼저 취업을 한 형들에게나 얻어 먹을 수 있던 '양주'라는 것도 이젠 좋은 의미이든 반대이든 '에잇'하고 한번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그 종류도 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정도가 되었다.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이유로 만나느냐에 따라 어느 술을 마셔야 하는 정도는 이제 좀 알만 하게 되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맞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그런데 이 즈음해서 술자리가 불편해졌다.
술을 즐기기 위함은 항상 그 술을 배경으로 '사람'이었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늘어난 지갑의 여유만큼 어른이 되었다는 우리는 그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 둘씩 그 '어른스러운' 술자리에 익숙해지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니, 취향일 수 있지만 그 취향이 자신이 취향인지 조차 모르채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히 즐거운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봐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가끔은 나도 웃어줘야 한다는 게 불편함일 뿐이다. 나에게 정의 되어있던,내가 경험해오던 '술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엔 '사람'도 없고 '이야기'도 없다.
같은 술을 마셔도 참 많은 생각을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참 많은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술자리가 더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이다.
그래도 조곤히 술잔을 기울이고 수다를 떨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진 몇 남아있고, 그들은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인지 '어른'스러운 '비싼 술'보다는 곱창집에서의 수다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주'한 잔이 나에겐 아직 더 기다려지는 술자리이다.